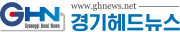▲ 최보영 작가
경기헤드뉴스 | 줄 서는 맛집이 생겼다고 하면 고민부터 시작된다. 애써 오픈런을 해 볼 것인가, 인기가 잦아들어 대기 시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때까지 기다렸다 갈 것인가.
미식가라고 하면 맛집에 할애하는 시간과 그 거리에는 조금의 주저함이 없고 배고픈 와중에도 힘들게 줄 서 기다리는 고통마저 즐길 거라 예상 하겠지만 게으른 미식가에게는 해당 되지 않는 일, 명확한 이유와 설레는 포인트가 있어야만 거듭된 고심을 끝으로 방문을 결정한다.

[해목]은 외관부터 일본식 목조건물을 연상시킨다.
코로나로 해외여행이 자유롭지 않은 지금, 잠시나마 식도락 여행이라도 떠난 듯 설렘과 위로가 될 만한 곳을 찾던 나는 기꺼이 대기를 하며 이곳에 섰다.
살랑이는 바람 덕분에 힘들지 않게 기다렸지만 자리에 안내되자마자 목이 탄다. 정오가 아직 되지 않은 시간이지만 식전주 라는 이름으로 술을 시켜본다. 찰랑거리듯 담긴 나무 술잔 안에 가득 술을 품은 유리잔이 들어있다.

원래 술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나무잔인 마스자케. 예전 일본에선 1합의 단위로 이것을 이용해 술을 팔았었다. 그런데 유리잔에 술을 팔려고 하니 1합에 미치지 않은 듯 하여 이 마스자케에 받치고 술을 가득 따라 주게 되었는데 결국 이것이 오늘날까지 전통이 된 것이다. 일본에 온 듯한 기분을 한껏 느끼며 천천히 유리잔에 있는 술을 먼저 마시고 난 후, 나무잔까지 마저 비웠다.
이곳에 오면 누구나 맛본다는 두 가지 음식은 크림치즈 같은 두부 요리인 모찌리도후와 일본식 장어 덮밥인 히쯔마부시다.

모찌리도후는 일본식 주점인 이자까야의 흔한 안주인만큼 큰 기대는 없었으나 부라타 치즈 같은 동그랗고 예쁜 원형 위에 콩가루를 흩뿌린 모양이 흥미를 돋운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곧 흘러내리는 모습마저 영락없는 치즈 같다. 몽글몽글 탱글탱글해 보이는 두부를 넣었더니 이내 입안에서 사라진다. 몇 번의 반복되는 젓가락질 후엔 빈 접시와 고소함만 남았다.
이제 나고야의 명물로 소문난 히쯔마부시를 강남 한복판에서 맛 볼 차례다.
온기가 나가지 말라고 닫아 놓은 뚜껑 사이를 뚫고 고소한 냄새가 날아와 코를 간지럽히며 기대감을 상승시킨다. 고슬고슬한 밥 위에 가지런히 올라간 장어들의 자태가 그야말로 곱다.
마치 아직도 날 못 맛보지 못했냐는 듯 현혹하듯 흐르는 윤기마저 탐스럽다.

히쯔마부시를 먹으러 가면 주걱으로 밥을 우선 4등분 한 다음 1/4의 밥으로 장어와 함께 먹어보고, 다른 1/4의 밥으로는 함께 내어주는 고추냉이, 파, 김 등을 섞어 먹어보고, 다른 1/4의 밥은 오차즈케로 먹어보고 마지막 남은 밥으로는 지금껏 방법 중 가장 본인에게 맛난 방법으로 다시 먹기를 안내한다.
게으른 미식가는 취향이 확고하다. 장어와 밥을 몇 술 뜨다가 이내 밥에다 차를 붓는다. 오차즈케란 밥에 차를 부어 먹는 식사나 요리를 말하는데 제대로 장어를 양념하고 구워내는 히쯔마부시 맛집이라면 이 방법이 진짜 맛있다.
장어가 비린내 하나 없이, 구석구석 양념이 안배인 곳이 없고, 또 그 양념이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채 완벽하게 잘 구워져 나와야만 맛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대감을 갖고 미지근한 차에 말은 밥을 한술 떠서 그 위에 장어 한 점을 올린 후 입안에 넣어 본다.

깊은 맛. 달고 짜고 맵고 쓴 자극적인 요소 하나 없이 그저 깊은 풍미가 온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듯하다. 마치 내 고향이 나고야였던가 아님 해목의 본점이 있는 부산이었던가 착각 할 만큼, 아주 오래전 먹어본 그리웠던 맛을 다시 보는 구수함이다. 그리움은 위를 한껏 열어주고 금세 그릇 바닥을 보이게 하는 위력을 발휘한다. 정말 기분 좋은 배부름이다.
이런 히쯔마부시라면 나고야에서 문을 열어도 문전성시를 이룰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생각을 뒤로 한 채 짧은 일본 식도락 여행의 꿈속에서 깨어났다. 게으른 미식가를 움직이기에 충분한 경험이라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볍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