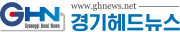▲최 보영 화가 & 작가

경기헤드뉴스 | 여기. 생각만 해도 썸 타는 이를 만나는 듯 설렘을 주는 곳이 있다. 한 번만 만나도 자연스레 각인되는 사람이 있듯, 이곳에 대한 단상은 한번 온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마성의 식당. 그 짧지만 명확한 설명에 담긴 깊은 애정을 가늠할 수 있겠는가?
게으른 미식가는 그 이름답게 가끔은 예약과 기다림이 싫어 바로 방문해도 비교적 안전하게 식사할 수 있는 맛집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압구정 [우가]이다. 예약을 하고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맛집들이 즐비한 이곳에 이토록 훌륭한 집이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니.
그건 흡사 아무 때나 연락해도 반갑게 만나주는 남자친구 느낌이다. 오죽하면 ‘고기는 사랑’이란 말이 있겠냐마는 굳이 고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오더라도 여기서 먹고 나면 사랑에 빠질지도 모른다.
오늘은 우가의 차돌박이를 먹어본다.
내어주는 기본 찬을 먹다 보면 붉은 빛깔을 띄는 얇게 잘린 고기들이 얌전히 누워 나온다. 한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티비에서 소만 나와도 맛 있겠다 소리가 나온다던데 게으른 미식가는 결코 그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달구어진 무쇠판 위에 치익 소리를 내는 차돌박이를 보고 있자니 아직 구워지지 않은 그 상태로도 그냥, 몹시, 심하게, 맛있어 보인다.

불판에 고기가 올라가면 직원분이 숙련된 솜씨로 토치에 불을 붙이고 차돌의 윗면을 그을리듯 익혀준다. 맛있는 불쇼같은 느낌이랄까. 좋다는 말보다 뭐가 더 확실한 표현일지 모르겠다. 토치에서 나오는 불바람 소리, 차돌 익어가는 소리, 그 속에 아름답게 피어오르는 황홀한 냄새. 그렇다. 좋다라는 표현이 모자라다. 이건 너무 좋은 것이다. 어쩌면 배고픔을 최고치까지 올려주는 마법의 냄새인지도 모르겠다.
고기가 어느 정도 구워지면 차돌 기름에 수북이 파채를 올려 구워준다. 지글지글 올라오는 파기름 향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파채까지. 모두 잘 익었다. 이제 먹을 일만 남았다.

처음엔 익힌 파채와 차돌을 함께 소스에 찍어 먹는다.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캬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입 가득 육즙과 파 내음 그리고 소스의 조화가 절묘하다. 한참을 이렇게 먹다가 초밥용 밥을 시켜본다. 이번엔 밥 위에 와사비를 살짝 올리고 그 위에 차돌을 덮어주고 난 뒤 젓가락으로 밥과 함께 감싸 먹는다. 완전히 새로운 음식을 먹는 기분이다. 덕분에 젓가락이 또 바빠졌다. 뿐만이겠는가. 넉넉히 시킨다고 했는데 추가 주문도 따라붙는다.
차돌을 먹다가 당근과 고추를 장에 찍어 본다면 아마 이 집 장맛 때문에 토장찌개를 안 시키고는 못 배길텐데 부른 배를 움켜쥐더라도 꼭 한번 맛보라고 하고 싶다. 사실 맛보았다 하면 탄수화물 중독이 어떤 건지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독이란 그런 것 아니겠는가. 알면서도 또 하고 싶어지는 것. 그래서 자제력을 오늘도 읽고 토장찌개를 마저 먹어본다.

여기서는 토장찌개가 나오면 밥과 함께 그 자리에서 잘 비벼준다. 토장찌개 자체가 자작한 국물에 야채와 두부가 어우러진 밥도둑 그 자체라 밥은 거부할 수 없는 디폴트다. 고기 냄새 가득하던 이곳이 이제 토장찌개가 장악했다.
구수한 냄새는 그 어느 때 보다 여기에 나를 집중시킨다. 처음엔 맛만 봐야지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맛을 계속 보게 되는 게 문제다. 뭐가 문제겠는가. 단지 나는 음식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 음식에 집중하는 것일 뿐 이니 말이다.

한참을 정신없이 먹다가 내어 준 아이스크림에 기분이 달콤해졌다.
생각해보니 이건 썸이랑 비할게 아닌 듯 싶다.
이토록 들뜨고 행복한 후에 만족스러운 달달함 이라니.
썸 아닌게 확실하다.
내 사랑.
우가.